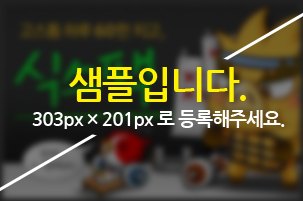순간 한 무리 떼의 아이들이 골목을 훑고 썰물처럼 사라진다.
살짝 먼지가 나풀거리는 골목엔 깨진 유리창과 축구공 그리고 한 소년만이 덩그러니 남는다. 한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소년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종이에 뭔가를 긁적인다.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내려 간 집 전화번호다. 몇 시간 뒤 한 아주머니 또한 능숙한 솜씨로 같은 골목을 찾아 깨진 유리창 값을 변상해준다. 넓은 학교 운동장도 좋았지만 좁은 골목이 더 편했다. 사방으로 공을 차도 멀리 도망갈 염려가 없었다. 자연스럽게 골목집 유리창이 남아나질 않았다.
시간이 흘렀고, 한국 축구의 간판 스트라이커로 성장했다.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선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. 월드컵 첫 골이 자책골이었다.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(1대4 패), 전반 17분이었다. 리오넬 메시가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에서 크로스 한 볼이 그의 오른발을 맞고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들어갔다. 어이가 없는 듯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탄식했다.
"말 보다는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.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." 벼랑 끝에 선 그의 출사표였다. 닷새 후 대반전이 있었다. 나이지리아와의 조별리그 최종전(2대2 무)이었다. 후반 4분 드디어 골망이 출렁였다. 그는 전매특허인 프리킥으로 팀의 두 번째 골을 터트리며 월드컵 원정 사상 첫 16강 진출을 이끌었다.
박주영(29·왓포드), 먼 길을 돌아왔다. '축구 천재'의 지난 4년은 파란만장했다. 병역 연기 논란에 휩싸였고,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축구 사상 첫 동메달을 목에 걸며 수렁에서 탈출하는 듯 했다. 하지만 새롭게 둥지를 튼 아스널은 족쇄였고, 최강희 전 A대표팀 감독과는 궁합이 맞지 않았다. 그라운드에서 그의 이름 석자는 사라졌다.
A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을 지울 수 없었다. D-데이다. 홍명보호가 6일 오후 2시(이하 한국시각) 아테네의 카라이스카키 스타디움에서 국제축구연맹(FIFA) 랭킹 12위(한국 61위) 그리스와 평가전을 치른다.
그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브라질월드컵의 마지막 시험 무대에서 드디어 끈을 잡았다. 단 한 번의 기회다. 그리스전 관전포인트는 첫째도 박주영, 둘째도 박주영이다. 생존이냐, 탈락이냐 갈림길에 섰다. 홍 감독은 그리스전에서 박주영을 중용할 예정이다. 살아남아야 한다. 박주영은 물론 카드를 꺼내든 홍 감독의 희망사항이다.
그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킬러다. 그리스전에 소집된 23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A매치 득점(23골)을 기록하고 있다. 다만 대표팀에서 골맛을 본 것은 2011년 11월 11일 열린 아랍에미리트(UAE)와의 브라질월드컵 3차예선 4차전(2대0 승)이 마지막이었다. 아스널에서 탈출해 왓포드에 둥지를 틀었지만 들쭉날쭉한 출전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다. 박주영이 넘어야 할 벽이다.
지난해 2월 6일 크로아티아와의 친선경기(0대4 패) 이후 1년 1개월 만의 승선이지만 간극은 느껴지지 않았다. 어색함은 없었다. 더 밝아졌다. 훈련장에선 미소로 가득했다. 인터뷰 전 "오랫만입니다"는 취재진의 인사에 "불러주시지 않아서"라는 농담을 건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.
현실은 또 다르다. 그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. 사활을 걸었다. 박주영은 "경기 감각은 부족할 것이다. 그러나 그것이 변명은 될 수 없다.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보여주고 나서 코칭스태프의 판단을 따르겠다"며 "그리스 평가전을 맞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틀 동안의 훈련이 전부다. 월드컵을 앞두고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서 부담도 되긴 하지만 팀에 녹아들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"고 강조했다.
배수진이다. 박주영이 그리스 골문을 정조준하고 있다.
김성원 단편선
蹴球天才 박주영
ㅅㅂ 내가 박주영 찬양 기사를 끝까지 읽게 될 줄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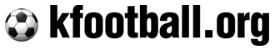











 미안, 이건 비추를 줄 수 밖에 없었어.
미안, 이건 비추를 줄 수 밖에 없었어.